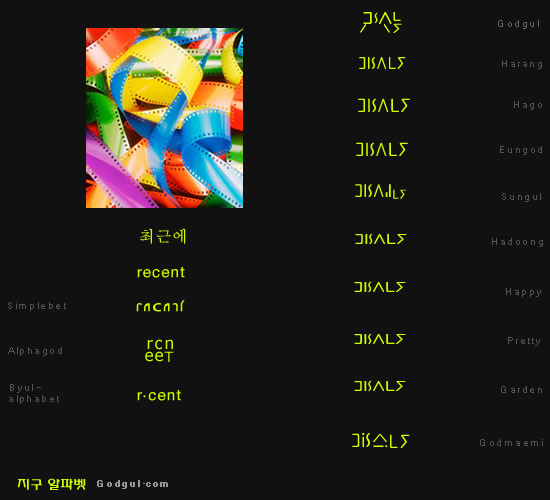
특별히 감상문을 길게 쓰고 싶지 않은 영화들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못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큰 감동을 못 받아서 그럴지도 모른다. 귀찮아서 인지도 모른다.
실비아 (Sylvia 2003)
여류시인 실비아의 사랑, 결혼, 독특한 시, 짧은 삶을 담은 전기 픽션이다.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으로 지적이게 나온다. 서구에서는 간혹 인기 끄는 소재지만 한국에서는 인기 끌기 힘든 '삶의 본질적인 고통' 같은 시를 써서 유명했던 시인인 듯 하다. 1950년대가 배경이다. 실비아가 시인으로서 성공과 실패가 핵심 내용은 아니다. 사랑과 결혼 이야기다. 어찌보면 국내에서 '전원일기'의 장수를 위협하는 유일한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한편 같은 이야기다. 보여지는 이야기 자체가 그런 타입이다.
영상미는 건조하고 무덤덤하다. 실비아의 시처럼 침울 모드 영상미다. 그다지 재미는 없지만 문학인의 인생을 비교적 담백하게 진실되게 그리는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에게는 괜찮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괜찮게 만든 영화지만 대중적으로 인기 끌 코드는 아니다.
행복의 스위치 (幸福のスイッチ, 2006)
매스컴에서 '우에노 쥬리' 해서 누군지 궁금해서 봤다. 우에노 쥬리가 나오는 첫작품을 본 셈이다. 껄끄럽고 까칠하고 무둑둑한 성격의 주인공이다. 동네 어른들께 꽤 여러번 '미술가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악의는 없고 그냥 성격이 그런 거다. 한번 쯤 이런 류의 캐릭터를 현실에서 봤음직 하다. 3명의 자녀 중에 주로 중간에 있는 자녀가 이런 성격이 종종 있다. 이 영화에서도 그렇다.
아버지, 딸들, 마을에 관한 이야기다. 이야기 자체로는 결코 한국에서 영화화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다지 흥미를 확 끄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1억2천만 인구의 일본에서 우에노 쥬리가 주연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제작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은근히 현대적인 담백함이다. 판에 박힌 패턴은 아니다. 섬세한 잔재미가 있다. 성인이 된지 얼마 안 된 소녀의 인생 성장기를 노골적이기 않게 유치하지 않게 괜찮게 만들었다.
딱딱하게 굳은 시루떡 성격의 소녀가 연애 얘기도 없이 아버지, 자매, 지역사회를 통해 잔잔하게 인식의 성장을 하는 이야기를 괜찮게 볼 수 있다면 이 영화는 재밌게 볼 수 있다.
노다메 칸타빌레(のだめカンタービレ, 2006 TV물)
우에노 쥬리의 '행복의 스위치'에서 투박하고 무덤덤한 주인공 '레이'를 좋게 봤는데 '본래 이런 캐릭터를 주로 연기하나 보다' 생각하고 '노다메 칸타빌레'를 찾아 봤다. 또한 워낙에 유명한 일드이기도 하다.
전혀 딴판이다. 180도 다른 캐릭터다. 내가 '행복한 스위치' 이후 상상했던 우에노 쥬리가 아니다. 만화적인 이 드라마에 맞게 코믹하게 연기를 잘 했지만 이야기 자체가 너무 거기서 거기로 맴돈다. 지저분한 방에서 피아노를 열심히 튕기는 우에노 쥬리는 귀엽고 괜찮지만 그 외의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못 느끼겠다. 그 외의 주조연 캐릭터에 매력을 못 느끼겠다. 취향 차이일 것이다.
1회는 정말 새롭게 재밌게 봤는데 3회쯤에 접었다. 인기도 많았고 재밌다고들 하지만 이야기 자체에 재미를 못 느끼겠다.
개인적으로는 '행복의 스위치'의 이야기와 캐릭터가 더 좋았다. 우에노 쥬리가 '행복의 스위치'에서 연기한 '레이' 느낌과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연기한 '메구미' 느낌이 적절히 융합된 그 어떤 이미지가 우에노 쥬리에게 어울리는 듯 생각된다.
허니와 클로버(ハチミツとクローバー, 2006)
미술대학생들의 청춘물이다. 진한 감동은 아니지만 잔잔한 아련함이 느껴졌다. 누구는 누구를 짝사랑하고 그걸 표현할 줄 몰라 주저하고 누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누구의 사랑을 도와주고 또 누구는... 전형적인 청춘 멜로 패턴이다. 여기서도 그렇다. 그렇더라도 뻔한 지루함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 현실적인 재미가 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중간에 멈출 정도는 아니고 영화가 끝나는 것이 아쉬워 크레딧이 미울 정도도 아니고 그런대로 볼 만 했다.
인디아나 존스4 -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Indiana Jones and the Kingdom of the Crystal Skull, 2008)
김밥 속에 어떤 반찬이 빠진 듯한 느낌이다. 결코 재미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나지도 않았다. 김빠진 사이다 느낌이다. 사이다는 주로 어르신들이 더 좋아한다. 해리슨 포드가 그런 수위에서 연기했다.
그래도 굵직하게 여기 저기 돈으로 떡칠한 티가 역력한 미술, 소품, 영상미가 위로한다. 끝까지 지루할 정도는 아니었다. 엑스 파일 같은 결론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대중적으로 수면재 같은 소재다.
기대를 좀 해서 그런가? 인디아나 존스 1편 '레이더스'의 순수한 느낌을 기대해서 그런가? 젊었을 때의 해리슨 포드를 기대해서 그런가? 재밌게 만들려고 공들여 노력한 흔적은 역력한데 실제로 본 느낌이 재미가 그럭저럭임을 숨길 수 없다.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거물 연기자, 감독에서 나오는 기본기는 베어있는 영화라서 수준 정도는 된다.
콰이어트 맨 (He Was a Quiet Man, 2006)
꽤 별로다. 한국 문화와 이질감도 높다.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나와서 봤는데 정말 영화적인 재미가 없다. 이야기도 별로고 캐릭터도 별로고 결말도 별로다.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나 감독을 한 사람이나 인간과 인간 문명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만 괜찮을 영화를 만들까 쉽다. 재미도 없고 캐릭터도 맘에 안 들고 조연들도 별로고 이야기도 별로고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도 별로다. 개인적으로 꽤 별로였던 영화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국내, 2008)
초반에는 꽤 재밌게 흘러가더니 후반부의 광야를 질주할 때부터 맥이 빠진다. 그 장면을 2분의 1로 줄였다면 좋았겠다. 국내 영화로만 치면 꽤 심열을 기울인 스펙터클한 영상이지만 헐리우드의 것들에 비하면 뭔가 부족했고 늘어졌다. 좀더 치밀해야 했고 길이는 좀더 줄였어야 좋았을 뻔 했다.
송강호 캐릭터가 영화를 살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 애니, 만화, 게임에서 봤음직한 뻔한 스토리와 캐릭터들이지만 송강호 캐릭터만큼은 한국적이다. 그 재미가 관객을 영화와 동행하게 만든다. (개인적으로 송강호보다는 설경구를 더 좋아한다. 두 배우 나름대로 자신만의 캐릭터 인감도장을 팠다. 그 인감은 현대 한국 영화의 구심점에 위치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액션 장르 영화답게 재미만을 위해서 만든 것 같다. 그게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이런 장르에서도 잘 만드는 자와 잘 못 만드는 자가 있다. 이 영화는 괜찮게 만든 편이다. 확실히 후반부가 아쉽다. 좀더 응축해서 고조 시키지 못 했다. 강렬한 액션 결말이 없다. 카타르시스를 못 느끼겠다.
재밌는 있었다. 괜찮았다. 이병헌은 '달콤한 인생'에서의 이미지가 더 멋있었던 것 같다.
님은 먼 곳에 (국내, 2008)
정말 2% 부족했다는 말이 이 영화에 딱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괜찮은데 영화가 끝나는 순간 깊은 감동은 혼탁하다. 우여곡절 끝에 생사를 걸고 부부가 만나서 부인이 남편에게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찡하다. 그러나 내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감동이 깊지는 않다. 현 시대 관객이 공감할 어떤 무엇을 끌어내지 못 한 것 같다. 이야기와 소재는 과거라고 하더라도 감동의 핵심은 현대인을 위한 무엇이어야 하는데 감동도 과거의 것을 제공하지 않았나 아쉽다.
국내에서 제작된 대작이고 근사하고 좋은 영화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뭔가 아쉽다. 영화로 성공시키기 정말 어렵다는 말이 실감난다. 솔직히 이 정도로 만들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관객은 팝콘 깨물며 냉정하다. 부족한 뭔가 때문에 크게 흥행하지는 못 한 듯 하다.
시나리오가 완벽히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보다 훨씬 못 한 시나리오로도 잘 만들어 흥행에 성공한 영화도 많다. 그렇다고 연출이 나빴다는 뜻도 아니다. 연기들도 그닥 나쁘지 않았다. 아무래도 현 시대를 절절히 반영하지 못 한 게 큰 잘못 같다. 여러 모로 아쉬운 영화다. 최근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다.
개인적인 바램은 과욕이지만 이런 정도로 정성들인 한국 영화가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러나 현 시대 상황을 보니 힘들어 보인다. 경제도 힘들고 영화계도 힘들다. 당분간 제작비 적게 들어가는 한국 영화가 가끔 나올 것 같다. 언제쯤 다시 이런 정도로 노고와 정성이 들어간 한국영화를 볼 수 있을까?
강철중: 공공의 적 1-1 (국내, 2008)
'좋다 별로다'로 따지면 '님은 먼 곳에' 보다 별로다. 그런데 이 영화가 더 대중적으로 성공했다. 공공의 적 시리즈는 1편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그래도 2편보다는 이 영화가 더 좋다.
너무 관객의 구미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흥행에 대한 부담으로 몸 사리며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든 티가 역력하다. 그런대로 재미는 있었지만 통속 만화책 읽는 느낌이다. TV 시리즈 보는 느낌이다. 그래도 설경구가 영화 보는 맛을 느끼게 해준다. 좀더 설경구 캐릭터를 과감하게 질주시켰다면 더 좋았을 뻔 했다.
강우석 감독 영화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류 국내 영화가 흥행해서 이런 영화라도 가끔 나와준다면 나쁘지 않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국내, 2007)
그럭저럭 노력한 흔적은 느껴진다. 외국 영화 시나리오 느낌 난다. 캐릭터 설정이 다소 억지스러움이 느껴진다. 홍보만큼 재밌지도 않았고 매력이 돋보이는 선한 캐릭터, 악한 캐릭터도 없었다. 안티히어로들 끼리 굵직한 대결이지만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카타르시스도 못 느꼈다. 본(Bourne) 시리즈 스타일 긴장감을 주려고 노렸했지만 기존 한국 영화에 비하면 발전했지만 현대 관객 눈높이 이상 성공하지는 못 했다.
이 영화도 준대작 쯤 되는데 흥행에 성공하지 못 해서 아쉽다. 이런 류 액션 영화가 추가로 나오기 힘들 것 같다. 국내에서 본(Bourne) 시리즈를 기대할 수 없나보다.
이 영화가 재미 없었던 문제는 컨셉, 시나리오, 캐릭터 설정, 연출 때문인 듯 하다. 몇몇 캐릭터와 배역이 어울리지 않는 점을 빼고는 대부분의 연기가 나쁘지는 않다.
2008년 10월 26일 김곧글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바마(Obama) 해서 떠오른 생각, 국내 공직 자리에 외국인을 스카웃 어떨까? (0) | 2008.11.06 |
|---|---|
| 보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혁신? (정치 무관) (0) | 2008.11.02 |
| 미래 인류에게 얼굴인식능력이 문자영역에도 생겨나서 유전된다면...? (0) | 2008.10.16 |
| 곧글 블로그 사이드바 미니 이미지 모음 (계속 업데이트) (0) | 2007.11.26 |
| 몇 년 전 찍었던 사진 몇 장 (0) | 2007.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