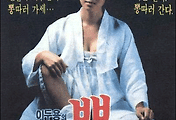만추(Late Autumn, 2011)
이야기에 어울리는 칙칙한 화면 질감도 괜찮았고, 상업영화스럽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예술영화에 푹 빠져있지도 않는 그 어느 지점의 영상미도 괜찮았다.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좋은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영화를 돋보이게 한 것은 솔직한 느낌으로 탕웨이의 연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인상적인 첫 장면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주인공 안나(탕웨이 분)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엿볼 수 있도록 제시해준다. 관객은 그것을 알게 된 반면, 그녀에게 작업을 거는 훈(현빈 분)은 그것을 모른다. 두 남녀 주인공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은 관객을 무의식적으로 엔딩크레딧까지 이끈다.
어떻게 보면 멍 때리는 듯한 시선과 표정이고 요즘 말로 멘탈붕괴(Mental Malfunction)라고 볼 수 있는 안나의 심리연기가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웰메이드 연기를 창조해냈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탕웨이가 원래 저런 성격의 인물이었는데 그동안 관객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런 연기였다. 속이 보이는 투명한 연못인데 헤엄쳐다니는 물고기나 수초들이 모호한 형상으로 보이는 오묘한 그 무엇이 좋았다.
어쩌면 이런 평가에 정작 탕웨이 본인은 이렇게 손사래를 칠지도 모르겠다. "난 그냥... 좀더 신경써서 연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과대포장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덩치는 팜므파탈인데 그 오묘한 인상때문인지 남자로 하여금 보호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여성팬들이 들으면 십중팔구 얼굴을 붉히겠지만, 현빈의 연기는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나빴다는 뜻도 아니다. 단순히 영어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해도 그렇다. 어쩌면 현빈이라는 네임밸류에 의해 은연중에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그 수위에 다소 못 미쳤기 때문에 연기에 감탄하지 못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나리오적으로 훈 인물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장면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훈이란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쉽게 떠오르는 기존 영화에서의 인물은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서 제이디(브래트 피트 분), 국내영화 중에서는 '멋진 하루'에서 조병운(하정우 분)이었다. 영화의 장르, 분위기, 인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사람의 관객 입장에서 그런 류의 남자의 분위기가 느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약했다. 여자를 살살 녹이면서도 어느 순간은 남자다운 면모도 보여주면서 색기 있고 생기 있는 성격. 물론, 현실 세계에서 그런 류의 남자 중에 훈과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보통 관객이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공감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현빈이 연기했던 영화 중에서 '백만장자의 첫사랑', '만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봤는데 내 생각에 가장 연기가 좋았던 작품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였다.
현빈의 입장에서 아직은 청춘흥행스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언젠가 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러 작품 후에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는데 성공했듯이 그 순간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작품을 선택하는 안목은 충분히 올라섰지만 그것을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 소화해내지는 못 하는 것 같다. 관객수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집합으로서의 자신의 연기력에 포함되는 다양한 부분집합으로서의 캐릭터를 연기하다보면 어느 순간 당대 최고연기자 반열에 올라서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상미는 시적이고 사랑에 관한 평범하지 않은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고급스럽고 세련되었고 멋있었다. 반면에, 이야기적으로 영화적인 임팩트가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충분히 영화적이었고 흥미로왔고 어떤 느낌도 있었지만 그것은 감동이 아니었다. 그냥 괜찮은 영화 한편을 봤다는 느낌 정도였다. 어떤 특이한 사랑의 한 측면을 느낄랑말랑 하는 순간 영화가 여운을 남기고 끝난 것 같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중간쯤에 놀이공원에서 마치 연극무대를 보는 것 같은 독특한 연출은 인상적이었다. 다소 늘어진 감이 있지만 매력은 있었다. 그 늘어짐을 만회하는 아이디어로써 처음에 관객입장이었던 안나와 훈이 어느 순간부터 판타지 상상으로 바뀌어 낯선 남녀를 대신 연기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그건 그렇고, 그 장면 이후에 분위기가 다소 전환되어 안나와 훈의 관계가 가파르게 발전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은 오히려 그런 상투적인 패턴을 고의적으로 피함으로서 세련화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 세련화된 영상을 추구했다는 것은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또한번 확연히 알 수 있었다. 근사하고 여운이 남고 매력이 있었다. 그러나 조금은 식상스러운 면도 있었다. 이런 느낌의 엔딩은 예술영화에서 심지어는 CF에서도 종종 봐왔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탕웨이 배우는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든 생각, 시애틀은 언젠가 한번 여행가보고 싶은 도시다. 비가 자주 오고 안개가 많이 끼고 구름이 많이 떠있는 도시, 사막에 세워진 도시 LA와는 아주 상반된 날씨다. 얼터너티브 락을 듣고 상상력을 요구하는 소설을 쓰기에 아주 좋은 날씨 분위기다.
2012년 3월 25일 김곧글
'영화감상글(Movi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2011) (0) | 2012.04.13 |
|---|---|
| 원더풀 라디오, 오싹한 연애, 네버엔딩 스토리 (0) | 2012.03.27 |
| 뽕(1985) - 정치 풍자극 (0) | 2012.03.24 |
| 오직 그대만 (2) | 2012.01.06 |
| 도가니, 파수꾼 (0) | 2011.12.26 |